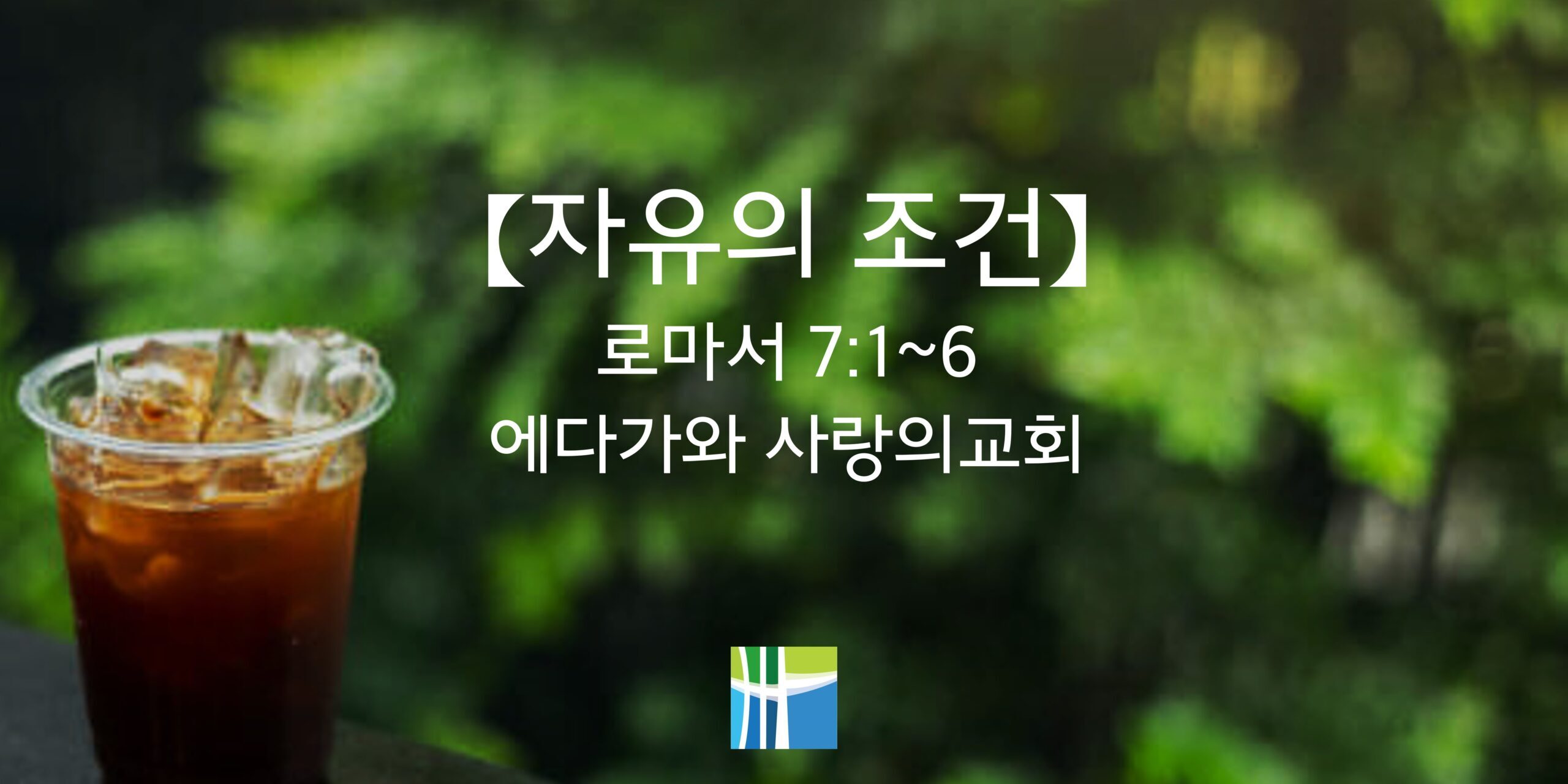로마서 7:1~6
7: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7: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찌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7: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
바울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했다. 물론 보편적 의미의 결혼이 아니라, 당시의 결혼제도을 둘러싼 정서을 말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관계이지만, 한편 법과 사회 질서가 강제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지배 아래 속박되어 있었으므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사회구조였다. 아내가 남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남편의 죽음이었다. 유대와 로마의 전통에 이혼이 없지 않았지만 예외적이었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동기는 아니었다. 결국 권리를 빼앗긴 여성이 자유와 해방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의 죽음이었다.
바울은 당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던 이 상황을 끌어와서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다. 인간은 율법 아래서 마치 부당한 남편에게 얽매인 아내처럼 자유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율법이 죽어야만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옛 남편 곧 율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된 것이라는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유라는 것은 이전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연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바울이 이 관계를 설명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받고 있는 여성은 그것을 지각하고 있겠지만, 종교적 억압은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울이 종교를 만들 생각이었다면 율법의 울타라ㅣ를 해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의 주제는 교회 조직이나 경건, 성화 같은 것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이다.
규칙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항상 중요한 것이다. 복음의 자유를 알았다고 해서 사회적 인간이 모든 규칙을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호소가 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호소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호소이다. 이것을 알면 바울의 가르침에 모순되는 것은 없다.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이다. 교회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